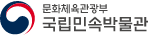연구 목적 및 의의
PDF 보기우리나라와 중국은 인접한 국가로 고대부터 많은 문화교류를 통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였고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다. 여러 문화적 교류 가운데 무술 분야의 교류도 일찍이 있어 왔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무술은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의 문화유산 중 하나로 유구한 역사 속에서 발전하였다. 고대 생존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원시종교, 오락의 한 형태로 시작하여 점차 정형화되었다. 사나운 맹수에 쫓기고 날랜 짐승을 사냥하면서 육체적 기능이 향상되었고, 석기부터 청동기, 철기로 이어지는 무기의 발달에 따른 이를 사용하는 무기술도 함께 발전하였다. 오래전부터 중국과 한국 양국 간의 무술 교류가 있어 왔지만, 공식적인 기록으로 살펴보면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발발에 따른 『무예제보』의 발간은 중국무술을 공식적으로 수입한 한 증거이다. 조선군이 일본군에게 크게 패배한 결과 선조 임금은 조선군의 군제를 개편할 필요성을 느끼고 1598년 명나라 척계광(戚繼光) 장군의 『기효신서』를 참고로 하고 명나라 장수 허국위(許國威)의 지도 아래 곤봉(棍棒), 등패(藤牌), 낭선, 장창(長槍), 쌍수도(雙手刀), 당파 6기의 도보를 만들어 병사들을 훈련하였다. 『무예제보』는 그림과 함께 언해가 수록되어 있어 일반 백성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만든 무예서이다. 당시 검과 창을 다루는 냉병기 무기술이 우리나라도 당연히 전수되고 있었지만, 그 무기술은 대부분 가전으로 구전되거나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비공개적으로 전수되었다. 따라서,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을 겪으며 냉병기 무기술을 갖춘 병사를 육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교습법의 필요성으로 인해 중국무술 교습서를 받아들여 참고하였다. 근래 본격적인 중국무술의 유입은 개항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항 후 임오군란을 겪으며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을 통해 중국무술이 들어온 지도 이미 100년이 넘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 전승되고 있는 중국무술은 전승 과정에 있어서 여러 요인으로 대만, 중국의 무술과는 수련 방법과 수련 내용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 내려오고 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가치를 현재 중국무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박하게 평가 내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전통무예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전통무예 육성 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2008년 제정되고, 2015년 개정된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전통무예는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무예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중국무술도 합당한 검증을 거쳐 전통무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이 논의에 앞서 근현대 중국무술의 도입과 전승 현황에 관한 기초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사연구를 기획하였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전승되고 있는 중국무술의 전승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근대 들어와 중국무술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계기는 20세기 초 화북 연해 및 산동 지역의 많은 농민과 상인이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그중 적지 않은 무술인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이다. 무술인은 상인의 보표(호위무사)로 들어오는데 인천 팔괘장인 노수전(1982년 졸) 노사도 보표로 들어온 경우라고 한다. 그런 가운데 1931년 일본에 의해 만보산 사건이 터지고, 한인과 화교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다.그 사건의 영향으로 중국 무술인이 화교 거주지에 머물며 화교를 한인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중국무술의 명성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이 물러간 후 화교 사회에서는 한국 내 여러 곳에 화교학교를 만들었고 화교학교에서는 비전임 교사로 중국 무술인을 초빙해서 교과과정의 하나로 무술을 가르쳤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무술은 다양한 종목이 널리 수련하고 있는데, 중국무술을 통칭하는 명칭은 공부(工夫)의 영어식 중국 발음의 표기를 따라 쿵푸(Kung fu)가 통용되었다. 오늘날은 무술의 중국식 발음인 우슈라는 명칭이 넓게 사용되고 있다. 우슈로 불리는 중국무술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에 들어가 있다. 경기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종목별 표준화된 동작을 표연 점수로 우열을 가리는 것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화려한 기교의 동작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중국무술에 대한 신비감이 사라지고 대중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무술을 쿵푸보다는 쿵후로 표기하여 사용하였고, 과거에는 십팔기(또는 십팔계)라고도 불리었고, 국술(國術)이라는 명칭도 사용되었다. 특히 쿵후라는 명칭은 1980년대 널리 사용하였다. 쿵후, 국술, 십팔기 등의 명칭은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아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무술의 황금기는 1960~1980년대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중국무술관이 생겨났고 중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중국무술을 수련하는 인구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은 중국무술에 대한 인식변화와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그 인기가 많이 떨어졌으며 많은 중국무술관이 문을 닫는 실정이다.본 글에서는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유산의 하나인 중국무술의 도입 과정과 화교에 의해 국내에 보급된 중국무술이 대중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중국무술의 전승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기에 따른 중국무술에 대한 인식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